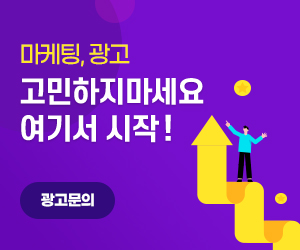두 사람은 외국 그림에서 보는 풍경처럼 아늑한 분위기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셨다. 그리고 강변의 그즈넉한 경치에 흠뻑 빠져들었다. 무성한 수초 사이를 가볍게 넘나드는 물새들과 이따금 수면 위로 치솟아 칼끝처럼 번쩍이는 물고기들의 활기찬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자, 취기도 가셨으니 그만 일어설까요? 더 늦기 전에....,” 현우가 먼저 일어섰다.
“그래요. 나도 저녁에 볼일이 좀 있어서.” 문희는 볼일이 있다는 핑계로 따라 일어섰으나 사실은 알딸딸한 기분을 좀 더 즐기고 싶었다. 아니, 아찔한 기분에 살며시 현우의 어깨라도 기대고 싶던 차에 벌컥 등을 떠밀린 것 같아 순식간에 자존심이 구겨졌다. 문희는 그날 이후로 따분한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얻은 듯 하루가 다르게 즐겁고 흥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평소 하지 않던 값비싼 맛사지도 받으면서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백화점 출입도 잦아졌다. 갈 때마다 현우의 물건도 혹처럼 달고 나왔다. 처음엔 넥타이 티셔츠 같은 사소한 물건이 고작이었으나 품질만은 최고급품이었다. 그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현우는 어린애처럼 환호성을 터뜨렸다.
“햐-! 누님의 고상한 안목이 어쩜 내 취향과 딱 맞죠? 누님의 심미안은 정말 알아 모셔야겠습니다." 현우의 환상이 터지면서부터 문희는 풀방구리 쥐 드나들 듯 백화점 출입이 잦아졌고, 물건을 고르는 손길도 항상 고가품에서만 놀았다. 현우의 생일선물로 구입한 금장金裝라이터만 해도 그렇다. 전면에 장식된 화려한 순금 문양을 장인匠人이 직접 조각한 명품중에 명품이었다.
그들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들이 장소도 점점 멀어졌다. 처음엔 양평, 다음은 춘천이나 원주, 거기에서 동해안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들의 호칭도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사모님에서 누님 동생으로 바뀌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서로 자기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게 된 것도 백일이 넘지 않았다. 그렇게 호칭이 바뀐 것은 그들이 동해안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부터였다.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망 좋은 호텔에 들어선 현우는 객실 문을 닫기가 바쁘게 문희를 와락 끌어안았다. 문희도 기다렸다는 듯 현우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현우의 품에 안긴 문희는 살짝 몸을 비틀었으나 허리에 감긴 현우의 팔이 더욱 억세게 옥조였다. 조금도 힘을 늦추지 않던 현우는 어느새 문희의 풍만한 앞가슴을 풀어헤쳤다. 오십이 다 된 문희지만 뽀얀 속살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탄력이 있었다.
“갑자기 멍어리가 됐어, 왜 말을 못해?" 기가 질려 말이 안 나오는 진수에게 아내는 빈정거렸다.
“지랄말구 빨리 들어오라구!”
“뭐, 들어오라구? 설마, 우리가 저 지난달에 합의이혼 한 걸 까맣게 잊고 하는 헛소린 아니겠지?” 그렇다.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몇 달 전, 아파트 시세가 한참 폭등 할 때, 진수는 1가구 2주택자로서 단순히 세금을 감면받겠다는 목적으로 주택 하나를 아내의 명의로 하는 동시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모면하기 위한 합의된 위장이혼이라는 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가 엄청나다며....,” 아내가 근심 어린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들이 현재 사는 33평형 아파트 말고 아내 명의로 주택부금을 들어 48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니 자연 집이 두 채가 되었다. 일이 되느라고 그런지 1년 뒤, 그 시세가 천정부지로 껑충 뛰다 보니 자연 입이 찢어질 건 당연한 일, 그러나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국세청의 발표에 그들은 복날을 앞둔 똥개처럼 애가 탔다. 안 먹고 안 입고 쓸 것 줄여 마련한 집인데 세금으로 목돈을 뺏긴다니 속이 탈 수밖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다가 집을 팔고 나서 바로 재결합하면 세금을 그냥 버는 거 아니겠어?” 진수는 지나가는 말로 운을 떴다. 혼자만 똑똑한 진수의 의견에 아내는 밑져야 본전이라 불만이 있을 턱이 없었다.
“최소한 1억이면 당신 2년분 월급인데, 그게 어디야? 옆집 깐순네도 내달에 이사하는데 40평짜릴 그런 식으로 늘려 간데요”
“그래, 남들 다 써먹는 편법을 우리라고 못 할 것 없잖아?” 아무리 위장이혼이긴 하지만 이혼이란 소리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껄끄러운 진수는 슬쩍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그건 편법이 아니고 지혜예요. 남들 다 하는 편법을 알고도 못 써먹는 사람이 바보 아녜요?”
“잔머리 한번 기똥차군”
“그게 다 당신한테서 나온 잔머린데 뭘?” 이렇게 꿍짝이 잘 맞는 그들은 한참 킥킥거리며 위장이혼에 합의도장을 거침없이 찍었다.
“이러다 진짜 이혼 되면 어쩌죠?”
“하면 하지, 못할 건 또 뭐야?” 진수는 빙끗 웃으며 어깃장을 놓았다.
“뭐,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아내가 눈을 흘겼다.
“살 만큼 살았으면 한 번쯤 임자를 바꿔보는 것도 멋있잖아?”
“무슨 소리야, 혹, 당신 미스 오하고 지금도 재미 보는 거 아냐? 당신, 말이 씨가 된다는 소리 몰라?”
“내 걱정 말고 당신이나 잘해!” 아내를 윽박지른 진수는 그때 무심히 내뱉은 말이 오늘 이렇게 옹골찬 씨로 싹이 틀 줄이야! 처음 며칠은 뛰어봐야 벼룩이지 싶어 오기로 버텼으나, 달포를 넘기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